 백성호
백성호문화스포츠부문 차장
한국 부모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시험 기간에는 “다 외웠니?”라고 묻습니다. 우리 교육은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외우는 것’을 중시합니다. 자식을 외국 대학에 유학 보낸 한 교수가 말하더군요. “아들의 시험지를 봤는데 점수가 별로 안 좋았다. 맨 끝에 담당 교수가 빨간 펜으로 ‘What is your opinion?(너의 의견은 뭐니?)’이라고 써놓았더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외운 걸 쓰기만 했다. 자신의 의견을 쓴 적이 없었다.”
부모들은 고민합니다. “어떡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해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보험’에 기댑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겁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으로, 다시 좋은 배우자로, 다시 좋은 인생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합니다. 그 외에 딱히 기댈 곳을 찾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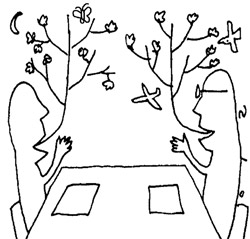
막상 대학에 가면 어떨까요. 생각하는 근육에 힘줄이 약합니다.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할지를 모릅니다. 누구도 나의 생각을 묻지 않았고, 나의 생각을 답한 적도 없으니까요.
유대인의 ‘넘버1’은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토론을 가르칩니다. 집안의 식탁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끝없이 떠들면서 묻고 답합니다. 토론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게 ‘넘버1’입니다. 부모도, 교사도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뭘 배울까요. “아, 내 생각이 친구 생각과 다르구나” “생각이 다른 친구랑은 이런 식으로 소통해야겠네”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 내 생각이 더 풍성해져. 고맙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구나.” 개성과 다양성이 생겨나고, 창의력과 소통의 힘이 생겨납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나의 물음을 좇아갈 줄 아는 아이들이 결국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행복의 단초가 있지 않을까요. 혹자는 “우리는 토론 문화의 토양이 약하다. 유대인처럼 가르칠 수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현문우답’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지만 저녁 식탁에서 초등학생 두 아이에게 탈무드와 흥부전 한 대목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촐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우물쭈물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앞다투어 목청을 높입니다. “괜히 겁먹었구나”싶더군요.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부모나 교사는 토론의 방식만 살짝 안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이 알아서 떠듭니다.
2011년 기준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는 185명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의 평균 IQ(지능지수)는 94입니다. 한국인은 106입니다(영국 얼스터대 자료). 두뇌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육 방식의 차이 아닐까요. 주 1회라도 좋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토론 과목을 개발해 도입하면 어떨까요. 10년 후면 대학생이 됩니다.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거기서 교육개혁과 창조경제, 다원화 사회와 행복한 삶 등 우리 사회의 화두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를 봅니다.
백성호 문화스포츠부문 차장